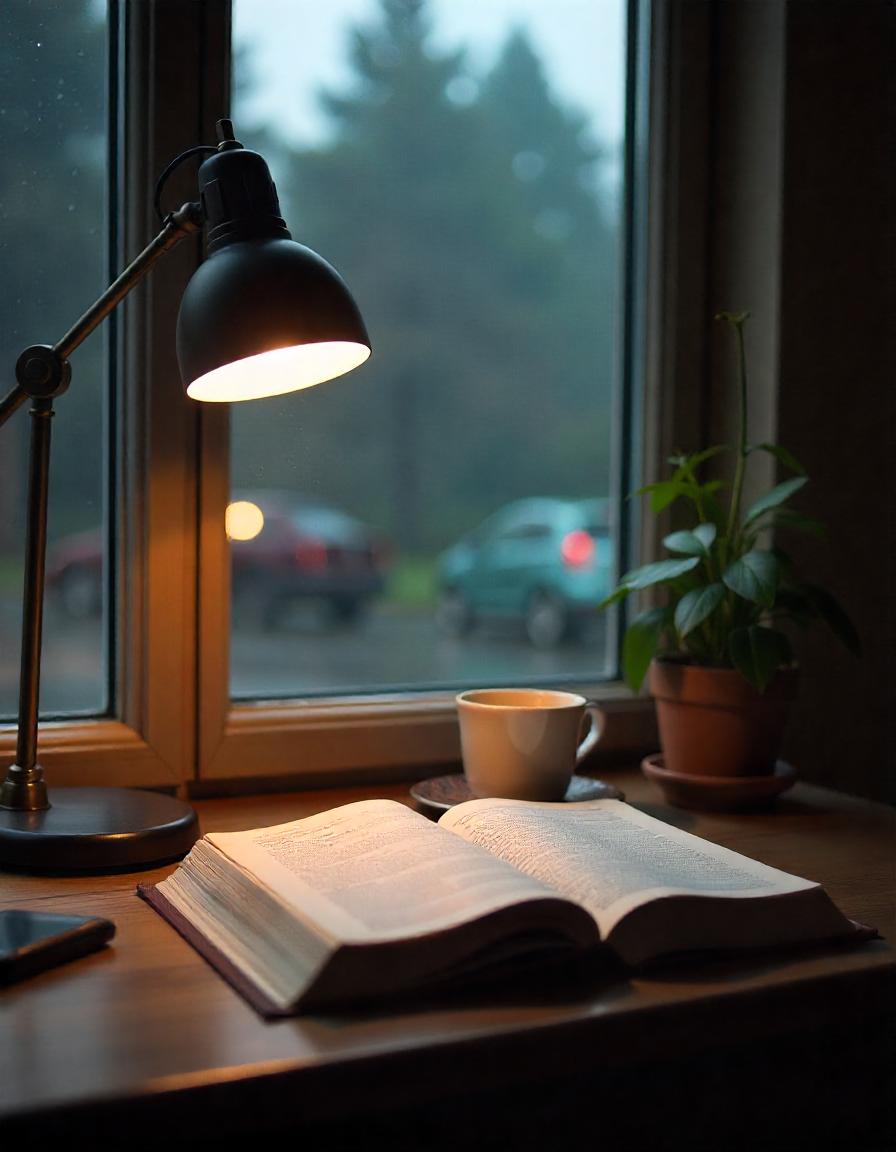
동시 에세이
1.왜 동시를 읽어야 하는가?
1.1 시가 내게로 왔다
1.2 내게 찾아온 한 편의 시
2.동시란 무엇인가?
3.동시를 읽는 즐거움 - 작품과 작가
3.1 비평적 에세이 쓰기의 실제 – 방주현의 『내가 왔다』를 통해
4.교실에서 동시 읽기
내게 찾아온 한 편의 시 -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동언
1.
누군들 그렇지 않으랴마는 바람이 있다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몸져눕지 않고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시간, 세 시간을 쉼 없이 정원과 숲과 해안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란다. 자연이 뿜어내는 기운을 마음껏 들이키며, 나 또한 자연과 다를 바 없는 한 줌 흙이었음을 거듭 깨달았으면 좋겠다. 애초에 흙이었거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에 아쉽고 두려울까.
눈도 밝았으면 좋겠다. 돋보기에 기댈지라도 언제나 책 속에서, 언어가 빚어내는 또 다른 숲속에 기꺼이 침잠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활자가 옆에 있는 한 나의 생각과 느낌은 시들지 않고 세상에 맞서고 또 세상을 넘어서 꿈꿀 것이니. 흐리고 침침할지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두 눈이 어설프게나마 제 몫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과하다 지청구를 듣게 될 듯하지만 귀도 들렸으면 좋겠다. 조금 가는 귀는 먹어도, 음악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루어낸 것에 비해 남겨둘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한 사람의 일들이지만 음악만큼은 그래도 인간이, 또 인간으로 살아남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웅장한, 때로는 섬세한 선율과 화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혼의 울림에 공명하고 싶다.
소박한 듯하지만 너무도 큰 바람이라 감히 청하지는 못하고, 그저 머릿속에 한번쯤 떠올려 볼 따름이지만.
2.
눈이 밝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언젠가는 그저 바람으로 그치겠지만 지금은 현재형이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구경하고, 이런저런 책을 읽을 읽으며 세상을 만나고 꿈을 꾼다.
얼마 전 읽은 책은 델리아 오언스의 소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었다. 가족이 모두 떠나고 홀로 늪지에서 살아가는 어린 소녀 카야의 이야기다. 홍합을 따서 파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오빠 친구 테이트의 도움으로 겨우 글을 깨치고, 그 남자를 사랑하나 서로 어긋나고 만다. 다시 혼자가 된 테이트는 습지 식물을 그리고, 생태를 독학으로 연구하여 책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그러는 와중에 카야를 눈여겨 보던 남자를 사귀지만 그는 살해되고 카야는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된다.
서사의 줄거리도 성장, 연애, 미스테리 등 다층적이며, 아름다운 습지와 함께 섬세한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는 이 소설에 인용된 한 편의 시를 읽고 화들짝 놀랐다. 미국이 자랑하는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였다. 카야가 오지 않는 테이트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단념한 채 인용하는 시다.
심장을 싹싹 쓸고
사랑을 잘 치워 두네
다시는 쓰고 싶을 일 없으리
영원토록
에밀리 디킨슨은 19세기 후반기를 살았던 시인으로 1775편의 시를 남겼고, 이 시는 번호 1108번이 붙은 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Bustle in a House
The Morning after Death
Is solemnest of industries
Enacted opon Earth –
The Sweeping up the Heart
And putting Love away
We shall not want to use again
Until Eternity –
어떤 집의 소란
죽음 이후의 아침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엄숙한 일이-
마음을 쓸어내고
사랑을 저만큼 치워버리네
우린 다시 쓰고 싶지 않으리
영원히-
가족 중 누군가가 숨을 거두었다. 그 다음날 아침, 喪家는 치러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일은 ‘사업’과도 같이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것이지만, 지상에서 수행되는 가장 엄숙한 일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으리라. 오래 알던 그/그녀가 떠난 빈자리를 언제까지고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쓸어내야 한다. 더 이상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마음 또한 치워버린다. 다시는 그 마음이 되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 그/그녀의 죽음과 함께 얽혀 있던 마음의 언어 또한 지워버리는 것이다.
3.
이 시를 읽은 다음 즉각 우리 시 한 편이 떠올랐다. 기형도의 시, 「빈 집」.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것이 아닌 열망들아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첫 연, 첫 행에 모든 상황을 툭 던져둔다. 디킨슨의 시가 ‘마음을 쓸어내고/ 사랑을 저만큼 치워버리는’ 일을 쓰기로 대신하려는 셈이다. 그러나 ‘쓸어내고’, ‘치워버리는 일’은 당연 현재가 아닌, 과거를 소환한다. 짧았던 밤, 겨울 안개, 촛불, 흰 종이, 눈물. 이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복수형이다. 거듭 반복되었던 일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열망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뭉뚱그려진다. 사실 모든 세목들은 다를지라도 동일하며, 열망들의 상이한 변주일 따름이다. 그러나 그 변주는 정교하다. 넓고 큰 것에서 작고 조밀한 것으로 응축되다 다시 뜨겁게 하나로 확장된다.
사실 이 시에는 비약이 존재한다. 잃어버린 사랑, 더 이상 내것이 아닌 열망들을, ‘나의 사랑’의 구체적 면면을 정치하게 구축했음에도 마지막 연에서 여전히 떨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잠그고, 가둬버리는 것 사이에는 비약이 있다. 시인 또한 이를 의식하기에 새로운 연으로 사고의 단절, 확장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디킨슨의 시를 읽는 순간, 죽음의 빈자리를 쓸어내고, 치워버리고, 다시는 사랑이란 언어를 쓰지 않겠노라는 대목을 읽는 순간, 「빈 집」의 비약, 그 틈새가 꽉 채워지는 것을 알았다. 기형도에겐 ‘쓰네’라는 행위가 ‘쓸어내고, 치워버리는’ 것이었던 셈이다.
사랑은 사람의 여러 감정 중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다. 하긴 사람에게 마음속 감정들 중 그 어느 것이 쉬울 수 있으랴. 나는 그 추상명사들을 떠올릴 때마다 모호함과 막연함으로 흐릿해지는 느낌이다. 그리움이란 뭘까? 생각이 나면 그리운 걸까? 이름이, 얼굴이 떠오르면 그리운 것일까? 동통처럼 왼쪽 가슴 아래쪽이 욱신거리면? 어떤 시에서처럼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 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무언인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리움이 넘쳐 중독처럼 그이의 주변을 서성이게 되면 사랑일까? 더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추상명사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가 있어 내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척도는 이별한 뒤에야 알 수 있음을. 무엇보다 이별은 추상명사가 아니다. 사실이다. 그 사실이 환기하는 고통도 구체적이다. ‘나 이제 더듬거리며’, ‘가엾은 내 사랑’은 측정할 수 있는 감정의 결이다. 결국 사랑은 떠난 뒤에야 그 깊이를 겨우 가늠할 수 있는 법이다. 시를 통해, 이별을 통해 사랑의 구체적인 면면을 떠올릴 수 있을 뿐이란 이 아이러니.
시는 열망이란 추상을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를 통해 보여준다. 명명하기 어려운 것, 불명료한 것, 느낌만 흐릿하게 감지되는 것, 무심히 지나친 것, 눈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한 편, 한 편의 시를 통해 뚜렷한 모습을 갖춘다. 그것이 내가 시를 읽는 까닭이다. 나는 시를 통해, 시에 기대 또 다른 세상을 익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앞으로도 계속 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건재했으면 좋겠다.
4.
그런데 사실 밝히지 않은 바람이 하나 더 있다. 간혹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 밤 늦도록 무논의 개구리 울음소리, 가을의 풀벌레 소리처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구 선생처럼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소원이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럴 깜냥이 되지 못함을 익히 알고 있다. 그저 허물없이 남의 손을 빌지 않고 내 앞가림만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도 허락된다면 운신할 수 있는 다리, 읽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그리고 다정한 벗들이 오래 함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다. 감히…….▣
'출간 전 연재 > 동시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시, 덜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작고 단단한 (6) | 2024.11.03 |
|---|---|
| 늘 오하이오우! (1) | 2024.10.28 |
| 작품론 - 찾기 전의 설렘을 곁에 두고 (2) | 2024.10.28 |
| 동시란? 좋은 동시란 무엇인가? (6) | 2024.10.27 |
| 3.1 비평적 에세이 쓰기의 실제 – 방주현의 『내가 왔다』를 통해 (6) | 2024.10.15 |



